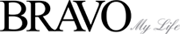
-
50+ 시니어
신춘문예 공모전

울퉁불퉁 삶을 품어주는 보자기
“여기 이 쇼핑봉투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보나마나 작아. 이건 너무 크고, 어쩐다?”
아이가 건네준 서너 개의 쇼핑봉투는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차례로 옆으로 놓였다. 내 앞에는 아이가 가져갈 옷들과 잡다한 물건들이 담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양이 어중간해서 쇼핑봉투로 한 번에 담으려는 손길을 무색하게 한다. 그렇다고 버스에 전철을 갈아타고 가야하는 길을 양 손에 짐을 들고 다니기에는 번거로워 딱 맞는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순간 무언가 떠올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갑 속에서 두둑한 상자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꺼낸 것이 바로 보자기였다. 크고 작은 색색의 조각보로 만든 보자기들, 그 중에서 제법 넉넉한 크기로 골라 짐을 싸니 한 번에 담을 수 있었다.
“어때? 좋다. 손에 들기도 편하고 예뻐서 보기에도 좋고.”
“응?....... 으응.”
아이의 얼굴에는 마뜩치 않은 웃음이 흘렀다.
“됐어. 어차피 내가 들고 갈 텐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제 짐을 쌌으니 나갈 준비해야겠다.“
하긴 나도 보자기를 서슴없이 손에 들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공부중인 아이에게는 영 어색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보자기는 쇼핑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짐을 옮기는 일을 전담했고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썼다. 내 기억 속에도 생전에 엄마가 볕 좋은 날 툇마루에 앉아 보를 만드는 모습이다. 주로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으로 크기에 따라 자르고 이어 붙여가며 만들었는데 특히 한복은 화사함이 좋아 조각보로 이어 붙이며 상보나 베갯잇. 보자기 등으로 탄생하곤 했다.
조각보는 크고 작은 조각들을 손으로 바느질해야 하고, 홑겹이기 때문에 시접을 서로 맞물려 고정시켜 나가는 쌈솔로 해야 한다. 그 과정이 한 번에 ‘뚝딱‘이 아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 붙여가는 부분은 홑겹이 두 겹으로, 바탕보다 진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도드라진 선은 다시 이어지며 완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무엇보다 조각보를 잇는 바느질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자칫 설렁설렁 바느질을 했다가는 모양이 엉성해지는 것은 물론 이음부분이 벌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전체적인 균형도 일그러지고 만다.
삯바느질로 자식 넷을 키워낸 엄마는 시내에서 꽤 이름 있는 한복집에서 일을 맡아했다. 자그마한 몸집에 무척이나 바지런했던 것처럼 바느질 솜씨고 좋아 주인아주머니로부터 손끝이 야물다는 칭찬에 단골손님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공부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면 엄마는 늘 화사한 한복과 함께 하고 계셨다. 그런 엄마 곁에서 어쩌다가 자투리 천으로 바느질이라도 할라치면 엄마는 세모난 눈길로 바늘을 놓게 했다.
“엄마는 한복을 만들지만 너는 한복을 맞춰 입어야 헌다. 암,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그래도 나는 엄마가 바느질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특히 한복을 만들고 남은 옷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나도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조각보로 이어감으로써 점점 커져가는 시간은 뿌듯함마저 갖게 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보자기에 짐을 싸면 특별함이 더해져 참 좋았다. 손끝으로 전해져오는 부드러운 질감도.
지금 돌아보면 조각보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탕이 되는 기본 조각보에 덧대어지는 크고 작은 조각들.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로 툭하면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했던 서러움으로 채워진 조각보 하나,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덤벼들 기세로 마음의 날을 세웠던 조각보 둘,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에 힘을 얻었던 조각보 셋.......
처음에는 조각보를 잇는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 이리 삐죽, 저리 툭, 이음부분이 삐져나오고 시접부분이 불거져 풀고 다시 바느질을 해야 했다. 그렇다고 다른 조각으로 대처할 수도 없었으니. 그렇게 힘듦으로 이어진 조각보는 내 삶의 든든함으로 자리 잡았고 은근한 배짱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할 날이 많기를 바라는 내 삶은 수많은 조각들로 이어져왔고 또 다른 조각들로 이어질 것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을 보내면서 얻게 되는 일상의 소소함과 그로부터 갖게 되는 마음이 풀어내는 것들로 조각보는 이어져가고, 한 숨 쉬어갈 때쯤이면 상보가 되고, 보자기가 되어 내 삶의 반짝이는 순간이 되어준다.
단발머리 깡충이며 아무 걱정 없던 그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앙증맞은 소반위에 차려진 밥상위에 놓인 상보가 전해주던 맛있는 즐거움으로. 자식의 나이에서 벗어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손수 지어주신 한복을 싸주던 보자기가 품어주던 설렘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엄마, 이제 나가야 해요. 버스 도착 10분 전이에요.”
“그래. 가자.”
나는 아이의 짐을 싼 보자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손끝으로 전해져오는 부드러운 질감이 기분 좋음으로 전해져왔다. 삶의 너울로 울퉁불퉁한 내 삶을 한 번에 안아주는 든든함으로.
조각보자기를 통해 내 삶을 마주한다. 빳빳한 쇼핑백보다는 조각보자기가 더 좋은 만큼 그 어떤 감정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듦의 여유로움을, 색도 크기도 다른 조각보 속에 담겨 있는 내 삶이 소중함을, 조각보를 바느질하며 남아있는 내 삶을 담아가는 주름진 손에 힘을 쥐어본다.